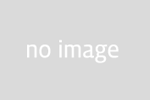칼럼
전체기사 보기-
< 독자 기고 > 슬픔을 통과하는 여정
김지민 작가 또, 가슴에 묻었다. 웃고 지내다가, 음식을 먹다가도 감정의 밑바닥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온다.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쿵 하고 모든 장기가 내려앉는 것 같다. 누군가는 슬픔에 기간을 정해 놓았지만, 지구가 멸망해도 끝날 수 없는 슬픔이다. 일 년 후, 십 년 후, 내가 살아 있는 한 미안하고 슬퍼할 것이다. 애도는 그런 것이니까.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어쩌면 슬픔을 통과하는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많은 사람이 슬픔에 갇혀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사람으로 사는 이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
- 한국유럽풋볼뉴스 기자
- 2022-11-22 10:34
-
[사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왜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국가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20·30대 소중한 청년들을 저 먼곳으로 보내야만 하는가? 이태원 참사로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던 20대 여성이, 지난 13일 숨지면서 이번 참사의 사망자는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집계되었다. 먼저 부상자들의 쾌유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 사건 발생이후 일련의 수습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닌데 이렇게 ...
- 정종남 기자
- 2022-11-15 17:25